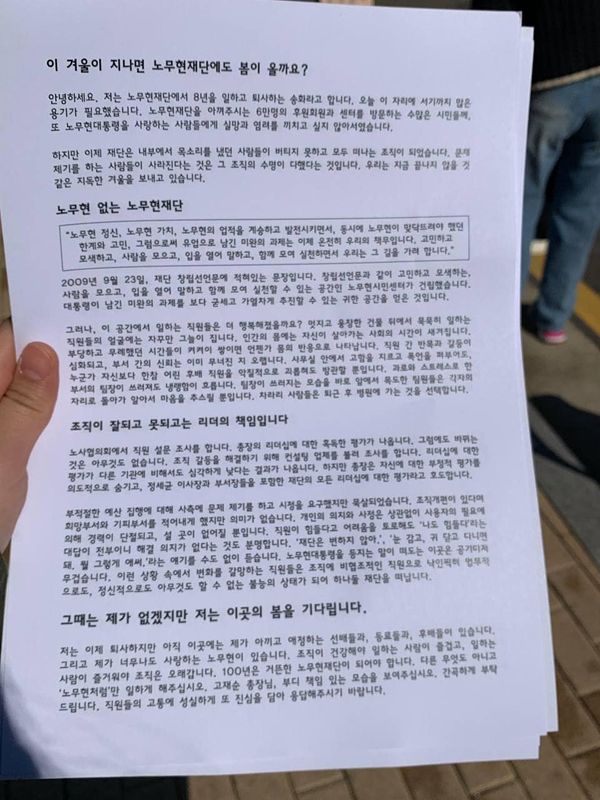아마 25년이 더 되었을 것이다.
학교를 졸업은 했는데 직장생활은 죽어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뭐 뚜렷한 대안도 없는 막무가내 삶을 살 때
아주 잠시잠깐 극장을 기웃거린 적이 있었다.
신촌이나 대학로의 예술영화전용관 비슷한
작은 극장들을 들락거리며 나름 영화에 매료되었고,
어쩌다 혼자서 포스터를 보고 동국대를 들러
난생 처음 영화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영화라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무려 25년만에 명지대 영화학과를 졸업하는 딸아이의 졸업작품전을 관람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고 한국영화는 일취월장 발전을 거듭해왔다.
기술적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접근성이 엄청나게 진전된 덕분이긴 하지만
어쨌던 25년전 작품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졸업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행복한 경험이었다.
사실 별기대 없이 딸아이의 졸업작품전이라니
가줘야지 하는 의무감만 가지고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 청년세대의 세상을 보는 시각의 넓이,
나름의 삶을 바라다보는 눈의 깊이,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름의 방법론을 만나볼 수 있었다.
제출된 4편의 작품을 일일이 평하는 것은 나의 능력 밖이니
일단 밀쳐두고 이번 작품들을 통해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세대가
부모세대로부터의 정신적인 독립을 위한
늦은 산고를 겪고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번 졸업전에 제출된 4편중 3편에
작중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문제가 놓여 있었다.
최지연 감독의 [날]에 비친 골통 아버지 한준,
김하나 감독의 작품에서 주인공 홍매의 아버지,
그리고 송화의 [비나리의 꿈]에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든
새로운 세대의 성장을 위해 '아버지'는
한번쯤 정리되고 처분되어야할 대상일 것은 분명하다.
사실 이번 졸업작품전의 컨셉을 한마디로 '지체된 성인식'이라고 한다면
편협된 시각일 것이다. 분명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관람한 이번 졸업전은
딸들의 (공교롭게도 작품을 제출한 졸업생이 모두 여학생이었다)
아버지 떨치기가 전체적인 컨셉으로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정신적 발달장애에 연유하던 아니면
강고한 기성세대의 세대지배가 원인이 되었든지
10대 사춘기 때 치렀어야 할 통과의례를
20대 청년이 치룬다는 것은 분명 문제 있어 보였다.
어디선가 읽었지만
지금의 시민운동이 청년세대 나름의 과제가 없이
80년대에 제기된 과제를 아직도 수행하는
낡은 시민운동의 보충대 정도로 소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역사의 진전은 분명 낡은 것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것에 대한 열광 속에 이루어진다.
늦었지만 홍매와 기열, 그리고 송화의 ‘아버지’로 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기원하며
이번 졸업전을 준비한 김소연, 김하나, 송화, 최지연 네 감독의
성공적인 작품활동을 기대한다.